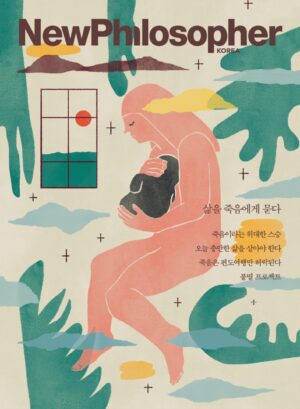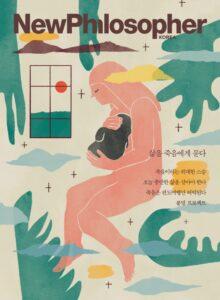뉴필로소퍼 Vol.9 삶을 죽음에게 묻다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교보문고에서 호기심에 한번 구입했다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과월호까지 구입해서 읽고 있는 뉴필로소퍼입니다. 칼럼이랑 인터뷰들이 내용이 길지 않아서 쉽게 쉽게 읽어지는 잡지입니다. 중간에 일러스트도 있고 카툰도 있어서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거예요. 혹시 철학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철학에 특별히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어려운 내용도 전혀 없고 흥미로운 주제도 많기 때문에 가볍게 읽으실 수 있으니 읽어보시길 추천해요. 진짜 진짜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관계자는 아닙니다)
뉴필로소퍼 vol.9 이번 호에서는 <삶을 죽음에게 묻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은 가장 끔직한 질병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하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에피쿠로스의 말로 시작합니다.
삶을 죽음에게 묻다
삶과, 죽음 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죽음을 너무 터부시 하거나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의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 하느라 삶을 두려워하면 안된다고 말이죠. 뉴필로소퍼 vol.9 호의 여러 기사와 글들 중에서 마음에 남았던 내용들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삶과 죽음
<삶과 죽음> 이라는 인터뷰 기사에는 전세계의 장례 풍습을 취재하는 사진작가 클라우스 보의 취재 사진과 대담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타나토라자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망한 가족의 시체를 집 안에서 보관하는 풍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을 ‘람부 솔로’라고 하는 장례 의식을 치를 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집 안에 모시는 풍습입니다. 고인은 정갈한 의복을 갖추고 관에 누워 있고 가족들은 포르말린이나 식초를 이용해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람부 솔로’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고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있는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기사 속 사진에서 가족들이 열린 관 안에 누워있는 고인을 들여다 보는 모습이 무섭다거나 슬퍼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시체를 돌보며 ‘람부 솔로’를 할 때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남은 가족들도 상실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잘 죽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철학보다 상상력이다
기술철학자이자 작가인 톰 챗필드는 <잘 죽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철학보다 상상력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본인이 부모가 된 이후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이 사라진 미래에도 계속 성장하고 살아나가야 할 자녀를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물론 작가가 현재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기사는 삶과 죽음 보다는 그 주제 속에서 가족(자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누군가의 출생과 죽음을 지켜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우리가 사라지고 난 이후의 미래를 살아갈 남은 이들을 상상해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을 투영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목적 없이 온전히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최초이자 최후의 것이 사랑이라고요.
이 글를 읽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표현은 저자가 아이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만 하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다. 시장과 함께 성장 중인 합리적 소비자이며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특정 기술을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물론 성인들이 보기에 여전히 각종 문제를 담고 있는 골칫거리이긴 하지만, 키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해가야 하는 시민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적절한 교육을 기다리는 빈 서판인데, 교육을 통해 길들여질 때를 기다리는 무정부주의 야만인으로 볼 수도 있다.
같이 성장해가야하는 시민이자 무정부주의 야만인의 양육을 걱정하는 저자의 마음이 글 속에서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녀의 경우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삶과 죽음에 대해 사색할 때, 여러 저명한 철학자와 사상가의 말을 사색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재를 함께하는 이들과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 속에 큰 행복이 있다
세네카의 글 <폴리빙스에게 보내는 위로> 입니다. 이 글에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을 깊게 추구한 여러 현인들의 말을 믿는다면, 인생은 고해(苦海)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거칠고 깊은 바닷속으로 흘러들어, 밀물과 썰물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어떤 때는 갑작스런 행운을 얻어 하늘 높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더 큰 손실을 입고 끝도 없는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여기저기로 흘러가는, 때로는 서로 충돌하거나 난파당하면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며 매번 돌풍이 불 때마다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항구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니 동생이 휴식을 얻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는 마침내 자유롭고, 마침내 안전하며, 마침내 영원해졌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세네카는 이탈리아 고대 로마제정기의 스토아 학자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유추해 보건데 형제를 잃은 지인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내용 같습니다. 아마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가늠할 수 없는 상실감과 슬픔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가까운 친척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조금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자유롭고, 마침내 안전하시기를. 아마 세네카의 지인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뉴필로소퍼 잡지에 관심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른 기사도 보실 수 있답니다.